[서평]보들레르 - 악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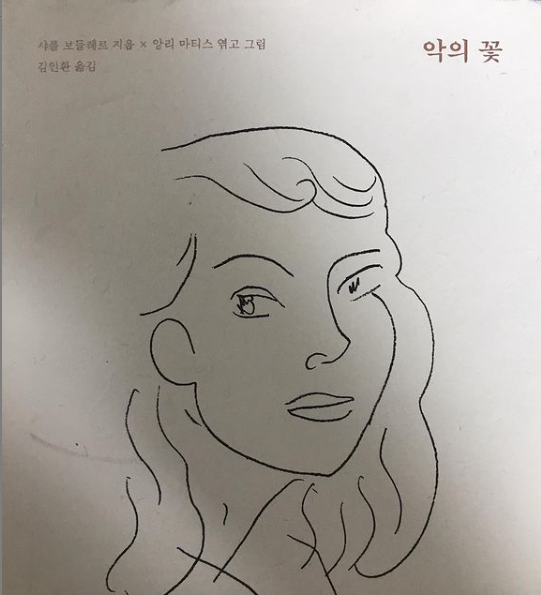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균형감각을 지니고 살 것이다. 자신에게 안락하고 편안하며, 친숙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안다면, 그 느낌을 찾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폈다가 하는 균형감각 말이다. 균형을 잡지 못한 존재는 흔들리고,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죽을 테다.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비행하며, 육상 동물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사람의 생은 그들보다는 좀 더 복잡해서, 관계와 노동과 사고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 조정을 능숙히 잘 해내는 이들에게 ‘사람 구실 한다’라는 명찰을 달아주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장대 위의 곡예사처럼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다.
그리고 슬프게도 시인은, 그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가볍거나 무거워서, 쉬지 않고 열심히, 크게 흔들리다가 떨어진다. 혹은 사라진다. 시인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시인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므로, 더 예민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민감성은 균형을 잡기에 필요한 ‘무던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국의 젊은 여성에게서 조국의 비열한 거리를 떠올리는 것(어느 말라바르 여인에게), 연인의 몸에서 자기 죽음을 찾는 것(망각의 강), 사랑하는 이를 통해 예감하는 예고된 좌절(하지만 흡족지 않았다), 영원히 성취할 수 없을 것을 갈망하는 자신의 비극적 본성을 옛 신화 속 동지에게서 발견하는 것(어느 이카로스의 비탄). ‘악의 꽃’이란 이름으로 한데 묶인 이런 흔들림들은 우리가 종종 낭만의 이름으로만 취급하는 보들레르의 필사적 기록이다. 시인의 대명사로서 보들레르 역시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끝내 떨어지고 다시 오르려다 떨어지는 자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흠모하고 동경하는 이유는 무얼까. 어쩌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 날아간 것이라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바닥이라고 취급하던 그 구역이, 지금도 끝내 발을 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저곳이 어쩌면 하늘이기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