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에드워드 사이드 - 경계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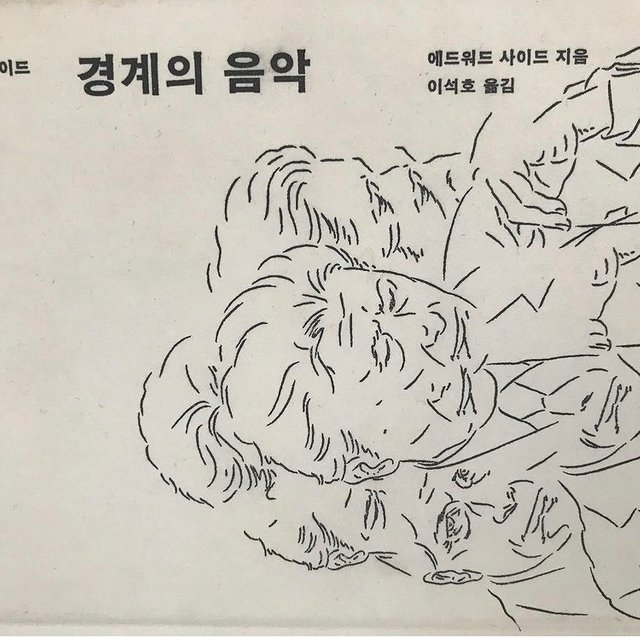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있는 걸까. 매달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내고 일정량, 혹은 무제한 -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으로 음악을 듣는 요즈음의 흐름을 보면, 역시 ‘소비’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다. 본인의 시간을 일정 부분 할애해서 음악감상에 집중적으로 쏟는 이들에게는 ‘구매’가 적당할 것 같고, 거대한 용량의 고품질 음원을 찾는 음향 애호가들에게는 ‘소장’ 이라는 말이 어떨런지.
우리는 음악을 산다. 녹음이 가능해진 현대의 어느 시점에서 부턴가 규격화된 품질로 상품성을 보장하는 음반은, 실제의 연주만으로 음악을 향유하던 과거에 안녕을 고했다. 그리고 ‘산다’는 행위를 창작자와 연주자 - 이 둘은 동일할 수 있다 - 청중 혹은 감상자로 이루어진 음악의 세계 속 강력한 동인으로 만들었다. 팔리지 않는 음악의 가치는 측정할 수가 없다. 시장 경제의 측면에서는 ‘0’에 가까운 효용을 지니며, 예술의 측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거나 후퇴적이기 때문일테다.
사이드의 비평이 가치 있는 것은 그의 정결하고 무거운 언어 때문 만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된 음악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가치와 인간 감정의 재발견, 고취라는 본령을 찾아나서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비평들이 주로 고전음악, 그리고 실연이라는 무대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저자의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이 제대로 쓸모를 다하기에는 이만한 음악적 지대 또한 찾기 힘들다.
사이드가 비평으로 다루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첫번째는, 비르투오소라고 불리는 이들의 연주에 대한 기술적 논의 뿐만 아니라, 그러한 테크닉들이 청자의 감상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 지에 대해서다. 폴리니, 미켈란젤리, 브렌델, 호로비츠, 리히테르, 그리고 특히 굴드 등, 클래식 음악계의 주류 스타로 대접받는 피아니스트들이 때로는 격찬을, 때로는 날선 칼질을 당하며, 우리가 그들의 테크닉에 현혹당하는 동안, 연주자로서의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혹사 당하는지 이야기한다.
두번째는, 카라얀과 토스카니니로 대표되는 현대 마에스트로들의 솜씨와 헤게모니다. 지휘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클래시컬 음악 산업계를 손에 쥔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이들의 제왕적 면모가 어떤 폐단을 낳고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논하는 그의 애호가적 태도는 날이 갈수록 산업적 면모를 갖추어가는 음악계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기 적합하다.
세번째는, 오페라와 주류악단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담론에 관해서다.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었거나, 작곡가의 생전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가치있는 작품들이 왜 주류 악단에게 선택받지 못하는지를 조명하며, 상연되는 오페라들이 잘못된 연출과 출연진 선택으로 어떻게 망가지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바그너의 작품은 특히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 등의 담론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데,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이 가해자로서 국제적 갈등의 주축이 되는 아이러니를 꼬집는다. 바그너의 작품이 갖는 음악적 가치와 현대 중동의 비극적 면모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토록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는 일은 사이드가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쉼없이 천착해왔기 때문일테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또다른 저작 <음악은 사회적이다>를 참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고전음악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지닌 그가 새로운 작품과 해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기성 작품만을 고집하는 제작의 세태를 비판한다. 진정으로 전통을 사랑하는 사이드가 ‘창작’의 가치를 옹호하며 존중한다는 사실은, 클래식을 음악 아닌 ‘상징’으로 변형시킨 애호가들의 태도가 예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꼬집는다. 전통이 뿌리가 되고 창작이 열매가 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 유지되는 핵심 과정인데 반해, 어떤 이들에게는 문화적 권력 다툼의 장으로서, 음악적 유산이 소모되고 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지만, 저명한 작곡가들을 다룬 전기문들에 대한 서평 역시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전기작가들의 관점과 논점에 대한 사이드의 비평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학자로서 살아온 그가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상당한 깊이와 넓이로 이러한 비평의 탑을 쌓았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일견 놀라올 수 있으나, 곱씹어볼수록 납득하게 되는 일이다. 음악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창작자의 개성으로 태어나는 혼합물이므로, 그것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려고 할 때, 순수한 음악적 기준만으로는 작품의 전체적 양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관통하고 유지하는 거대한 구조들을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일이라면, 그 다양성을 파악하는 눈이 혼합물로서의 음악을 파고들 때에 대단히 좋은 효율을 내리라는 것 역시 가능한 일 아닐까. 더군다나 사이드는 음악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음악비평이라는 일은 그에게 매우 적합한 일이었을테다.
부디 또다른 <경계의 음악>을 읽을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이 누구의 저작이 되든 간에, 창작자와 유통사와 청자 모두에게 잊어버렸던 본령을 일깨우고 즐거움과 성취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극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이러한 비평은, 창작의 부산물로 절하될 가벼운 흩날림이 아니다. 창작이 낳은, 창작을 되찌르는 창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