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제망매가>로 생각하는 생사(生死)의 길
- 생사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생, 죽음, 사랑, 이별과 같은 통과의례적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통과의례는 당연히 오랫동안 우리 문학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고, 후세에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원형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인간이라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의례의 마지막 여정 죽음을 다루고 있으며, 또 그 이별의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남겨진 이’가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으며, <제망매가>를 다시 읽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작품 속 시어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과 그에 대한 나름의 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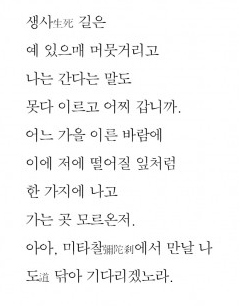
<제망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면서 지었다는 10구체 향가이다. 일찍이 불교적 측면에서 망자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가로, 현존하는 향가 중 가장 뛰어난 서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 '생사길'& '미타찰'
먼저 ‘생사길’은 삶과 죽음이 분리된 공간이다. 우리는 언제나 가는 곳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화자는 “가는 곳 모르온저”라며 솔직한 고백을 한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바로 '미타찰'이다. ‘미타찰’은 미타신앙에서 비롯된 말로 불교적 색채를 짙게 띠는 듯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이 작품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으로써 극복하는 글로만 여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사길'과는 대비되는 '미타찰'의 의미에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타찰'은 삶과 죽음이 혼융된 공간이다. 삶과 죽음이 혼융된 공간?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 또는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며 슬픔을 겪고 있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삶과 죽음이 혼융된 공간이라는 것은, 남겨진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함께 위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의 의미이다. 더욱이 이 작품의 시점이 남겨진 사람임을 감안할 때(월명사로 대표되는 시적 화자)미타찰은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남겨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나마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돌파구의 의미에까지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미타찰’의 의미는 미타신앙의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 인간적 정감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 '머뭇거리고'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난해 했던 시어는 '머뭇거리고'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단 말인가? 학자마다 여러 해독의 차이를 지니기도 하는 '머뭇거리고'는 그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는가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낳는다. 필자는 이 주체를 '남겨진 이'로 보기로 했다. 언제든 떠나는 사람은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떠난다. 떠나는 사람은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갈래에 서 있지 않다. 남겨진 사람만이 그 삶과 죽음의 길에 서 있을 뿐이다. 남겨진 사람만이 삶과 죽음의 길 위해 홀로 서서 죽음의 길로 이미 떠난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남겨진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쉽게 보내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참을 그 길 위에서 머뭇거리는 것이다.

- '떨어질 잎'&'한 가지'
이제는 밋밋한 비유인 이 표현들은 단순히 남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담고 있는 시어로 읽힌다. 생명은 참 질기다는 말이 있다. 이에 작품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은 질긴 가지로부터 태어난 생(生)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생(生)은 너무도 가볍기에 어느 이른 바람이 불어올 찰나에는 언제든 떨어지는 잎이 되고야 만다. 이러한 비유 역시 아슬아슬한 생사길에 놓인 인간의 생을 아주 적절히 대변해낸다.
이로써 <제망매가>은 누이를 잃은 작자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해버리고 마는 특정 개인의 정서를 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는 모든 이가 겪는 보편적 슬픔과 위로의 글로 기억된다. 이 작품에 담긴 정서는 시공을 초월하며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공감의 정서로 자리 잡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기형도의 <가을무덤-제망매가>에서부터 복효근의 <제망매가 풍으로>, 김인육의 <다시 부르는 제망매가>, 뮤지컬 <쌍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변용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문학의 가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처음 감상을 쓰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작품이 도리어 삶과 죽음의 길 위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며 ‘남겨진 이’의 역할을 해야 했던 어려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고 있다. 작품 감상을 마무리하는 동안 날이 밝았고, 발인이 시작되었다. 이제 ‘남겨진 이’는 먼저 ‘떠난 이’와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미타찰’의 공간을 기다려야 한다.
머뭇거리는 '남겨진 이'가 되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고도 '남겨진 이'의 역할은 언제나 어렵고 무겁습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팔로우 할게요
댓글과 팔로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