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책을 탐하다] #06 세상에, 항문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니! - 캐나다 동부에서 <불가능한 여행기>와 더불어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지피에스(GPS)도, 비행기도, 여행안내서도 없던 시절의 여행자는 어떻게 대륙을 횡단하고 대양을 오갔을까?
물론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뜨리기 전부터 지도는 있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는 뱃사람의 허풍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지도 제작자들은 부둣가에서 흘러 다니는 뜬소문을 가져다 최신판 지도를 만들어내기 일쑤였고,
‘내 이름을 딴 섬을 갖고 싶어요!’
어떤 지도 제작자는 마누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지도 위에 가상의 섬을 그려 넣기까지 했다고. 그러나 21세기에도 뜬 소문을 믿고 고려, 조선, 일제시대 난파한 보물선이 서해 바다에 묻혀 있다며 용쓰는 사람들이 있듯이, 당시엔 엉터리 지도와 소문만 믿고 머나 먼 길을 떠나고 머나 먼 바다를 건너는 여행자들이 이건희의 회장의 차명계좌수보다 많았던 모양이다.
캐나다 지역을 처음으로 탐험한 자크 카르티에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캐나다 퀘벡으로 가는 길은 초고속 비행기가 오가는 시대라곤 하지만 쾌나 멀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 즈음 한국 국경을 벗어난 나는 밴쿠버공항, 몬트리올공항, 퀘벡공항을 거쳐 자정에 이르러서야 힐튼 퀘벡 호텔에 도착했다. 비행기 안에서 16시간 넘게 잠을 잔 탓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참으로 착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에선 잠자는 것 외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다행히 힐튼 호텔의 이불과 베개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던 뭉게구름마냥 폭신했다. 그래서 곧 잠 속으로 푹 잠길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퀘벡(헐리우드에서 유럽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다운 풍광을 찍을 수 있는 곳.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나오는 1967년 프랑스 중부 소도시 몽트리샤르(Montrichard)는 퀘벡의 올드타운을 찍은 것이다. 영화를 보았다면 기억날 것이다. FBI 요원 칼 헨러티로 나오는 톰 행크스가 12월 24일 위조수표를 찍어대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로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던 장면),
몬트리올(몬트리올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의도 마냥 세인트로렌스강 한가운데 크루아상 빵처럼 생긴 섬이다. 몬트리올 전경을 보고 싶으면 몬트리올의 유래가 된 ‘마운트 로얄’에 올라가면 된다. 해발 234미터에 불과하지만 평평한 몬트리올에선 유일한 산이다),
오타와(캐나다 수도로 버락 오바마가 맛있다고 극찬한 비버테일빵으로 유명하다. 이 빵은 이름 ‘비버의 꼬리를 다져서 넣은 빵’일 거라고 여기면 곤란. 붕어빵엔 붕어가 들어있지 않다! 비버테일빵은 호떡을 비버꼬리처럼 길게 죽 늘인 것에 불과하다. ),

킹스턴(가까이에 천섬 아일랜드가 있다. 세인트로렌스강 위에 한 점, 한 점, 마치 꽃잎 같은 초록빛 섬들이 1,000개나 떠 있는 곳. 천섬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1,860여개의 섬이 있다. 넓이는 전원주택 한 채 겨우 들어갈 정도부터 야구장을 짓고도 남을 정도까지),
토론토(온타리오 호수와 접한 도시로 랜드마크는 CN 타워. 553미터에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다. 토론토의 마천루 사이로 슈퍼맨을 처음 연재한 신문 ‘토론토 스타’가 보인다. 비쭉비쭉 솟은 빌딩들이 마치 슈퍼맨이 탄생한 크립톤 행성의 수정 같다)까지 열흘간 여행을 했는데,
캐나다 동부를 여행하면서 늘 듣게 되는 이름이 있다. 공원의 동상이며 마주치는 간판이며 온통 ‘자크 카르티에’란 이름을 달고 있다. 캐나다 동부의 주요도시들은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생긴 도시(그래서 각 도시에 들릴 때마다 유람선을 탔다), 저마다 자크 카르티에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는 갖고 있다. 유람선 갑판 위에 서 있으면 1535년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처녀지’라고 여기며 강을 거슬러 오르던 자크 카르티에의 심정을 자연스레 상상하게 된다.

비록 당시의 유럽인들이 여행을 떠난 동기가 여행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첫째 돈, 둘째 파라다이스 신드롬, 셋째 명예’였다 하더라도 그 시절의 여행은 정말 흥미로웠으리라. 낯선 풍경,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처음 맛보는 과일,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 아아, 탐험의 시대!
영국의 저널리스트 매튜 라이언스는 <불가능한 여행기>에서 ‘허구와 진실이 불분명한 그 시절’에 기록된 숱한 이야기 속에서 네 가지 기준(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가고자 했던 여행 2.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갔다거나 그곳을 봤다는 여행 3.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행 4.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믿기 힘들거나 있음직하지 않은 여행)에 해당하는 24편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발췌해서 들려준다.
책 속에 수록된 대부분의 여행기는 인도, 중국, 몽골 등 유럽인이 아시아로 오던 여정에서 생긴 일들이다. 혹자는 마르코 폴로가 그랬듯 해 뜨는 동쪽으로 길을 떠났고, 혹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랬듯이 해 지는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지피에스(GPS)도, 비행기도, 여행안내도 없었으니, 뭐 죽거나 나쁘거나! 그리고 갖은 고생(실상 ‘관광’이 아닌 ‘여행’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끝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여행자들은 허풍쟁이가 되기가 일쑤였다.
‘어차피 아무도 안 가본 곳인데 좀 과장한들 뭐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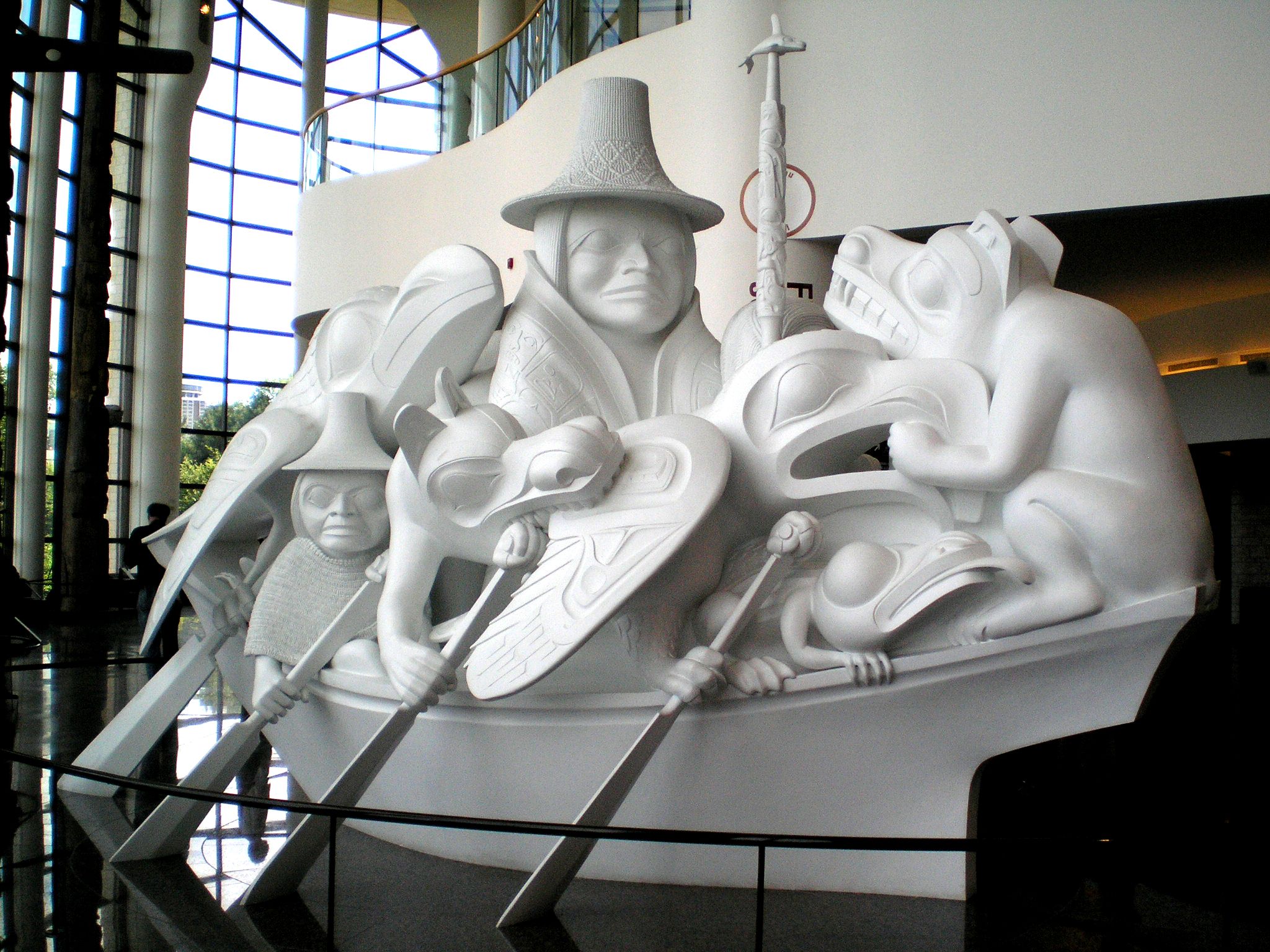
혹은 여행을 계속해 나가자니 돈이 필요하고 여행자금 혹은 탐험 후원금을 뜯어내려면 최소한 ‘금덩어리 구르는 강’과 ‘크리스탈로 뒤덮인 산’ 정도는 봤다고 구라를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프랑스 출신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는 제 입으로 구라를 푸는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구라를 풀어줄 인디언 추장을 납치해 프랑스로 데려갔다. 인디언 추장은 프랑수아 국왕에게 금과 루비로 가득한 나라, 항문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야기도 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항문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니!
초등학교 1학년생도 ‘뻥까고 있네!’라며 믿지 않을 이야기지만 어떤 합리적인 만류도 프랑수아 국왕의 정복욕을 단념시킬 수는 없었다. “다시 가서 금과 루비, 항문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나!” 하긴 황금에 눈먼 자들에겐 뻔한 허풍을 분별할 지혜도 생기지 않는 법이지.
“이 사람아, 추장은 그저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꾸며낸 거란 말일세!”
글/사진 @roadpheromone
영화에서나 볼법한 풍경들이 이어지는군요.ㅎ
잘보고 갑니다!
반가워요, @tip2yo 님. 덕분에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듬뿍 얻을 수 있겠네요 ^^
고퀄리티의 글과 사진에 감탄하고 갑니다.
항문없는 사람들의 나라라니 ㅋㅋㅋ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혹했을거 같네요 :)
보팅하고 갑니다 :)
매튜 라이언스의 <불가능한 여행기>에는 황당한 여행기가 많지만 '항문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황당했다는 ㅎㅎ 세상에 '위로 먹긴 했는데 아래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 ^
글을 재밌게 잘 쓰시네요. 아, 나도 해외여행 하고싶닷.
여행하고, 글 쓰는 게 직업이랍니다. @naha 님의 소설도 재미난데요! ^ ^
와~~~ 좋은 직업이네요. 저도 결혼 전엔 잠깐 꿈꿔보긴 했는데... ^^
앗, 소설 재밌게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
저야말로 읽어주셔서 고마울 따름. 좋은 작품 줄기차게 써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