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모리스 블랑쇼 - 도래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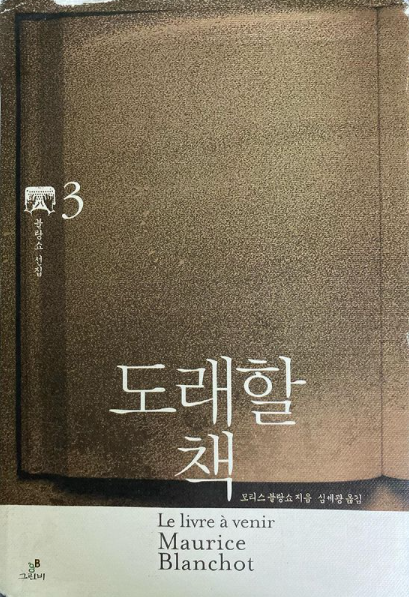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처음으로 접한 뒤,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또한,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다른 이의 세계에 여러 번 재진입을 시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노동은 육체의 노동 못지않게 시작하기 쉽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썩 내키는 일조차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 독자들이 블랑쇼를 높은 성벽처럼 느끼게 만든다.
블랑쇼를 읽는 일은 그의 저작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인 ‘원환’의 궤도를 따라 걷는 것과도 비슷하고,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작가들, 그가 연구한 문인들이 전례에 없던 기성 집필 방식의 해체와 표현방식에서의 극렬한 갈등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근·현대의 유럽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인 디드로, 프루스트, 브로흐, 헤세, 무질, 폴 발레리 등을 비롯하여 말라르메에 이르기까지 블랑쇼가 탐구했던 인물들은 문학을 만들고 탐구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식에서 어떻게든 일말의 변혁을 꾀했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언급한 이들이 변화와 탈피를 위해서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이 작가로서 살며 느끼는 위협과 그에 따른 예술가적 본능의 반항이 기성의 방식과 충돌했으리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블랑쇼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하나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작업대, 360도의 시선으로 대상을 탐구할 수 있는 작업대, 즉 그의 영민한 철학·과학적 사고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작업을 고통스러운 쾌락처럼 끊지 못하는 듯하다.
블랑쇼의 분석을 하나의 종합된 결론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가 질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음표가 붙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다시피, 블랑쇼의 연구는 대상을 선형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도구로 살핀다. 그래서 독자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결론을 만나는 대신,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순환적 얼개를 체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야만 한다. 블랑쇼의 방식대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독자는 이 힘겨운 책을 ‘읽기’만 하게 될 뿐이다.
저자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반박하여 다시 질문하는 순환을 볼 때 한 가지 남는 의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 이다. 블랑쇼가 전쟁 같은 탐구를 벌이며 찾는 문학의 부스러기들, 조각들은 결국 어디에서 온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글은 혼자만의 것일까, 우리 모두의 것은 될 수 없는 것일까. 글이, 책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승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사회와의 접점을 만드는 혼돈의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문학을 어느 정도로까지 만 내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더군다나, 모든 이야기를 외부를 위한 포르노로 목적 변경시키는 이 시대에 ‘도래할 책’이라는 것이 정말 도래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왔다가 상해버린 것인지, 올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인지, 나는 책의 결말에 이르러서도 쉬이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없다.